거두절미 결론:
주황색빛이 멀리까지 잘 보이고 안개속에서도 잘 투과되어서
590nm 파장의 주황빛을 내는 저압나트륨등을 사용한다.
기존의 수은등은 3개의 파장을 내는 백색빛으로 효율이 비교적 떨어지며
중금속인 수은이 해로워서+벌레가 많이 꼬여서의 이유도 있다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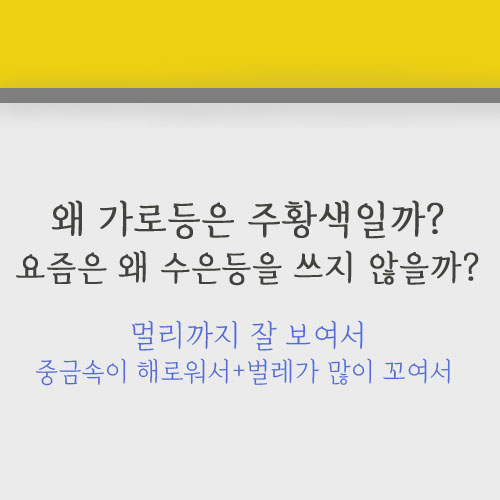
이전엔 3개의 파장을 동시에 내는, 백색 빛의, 수은등을 가로등으로 많이 사용했는데요즘엔 1개의 단일파장을 내는, 주황빛의, 저압나트륨등을 많이 사용한다.
바꾸게 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
1) 여러가지 파장을 내는 기존 수은 백색등에는 주광성(빛을 좋아하는) 벌레가 많이 꼬여서
2) 단파장을 집중적으로 내는 것이 훨신 효율이 좋아서.
3) 주황색 빛이 멀리까지 잘 도달해서
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은
보라색에 가까울수록 파장이 짧고, 빨간색에 가까울수록 파장이 길다.

파장이 짧을수록 직진성이 강한 대신 장애물을 넘어가지 못하며
파장이 길수록 직진성이 약한 대신 회절이 잘 된다.
파장이 길어 회절이 잘 된다는 것은,
멀리까지 도달할 수 있으며 안개 등에서도 잘 투과된다는 점이다.
이 점은 가로등에 적합한 특성이다.
그러면 빨간색을 쓰지 왜 주황색을 쓰는가?
빨간색을 쓰면 빨간색을 사용하는 신호등과 구분이 가지 않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.
그렇다면 3파장의 백색빛을 내는 수은등이 구분하기 좋고 더 잘 보이지 않겠는가?
3파장 백색빛의 수은등은 효율상의 문제가 있다.
수은등은 3개의 파장을 동시에 내야하는데
저압나트륨등은 가장 효율적인 단일파장 하나만을 집중적으로 내면된다.
그리고 구분이 사람뿐만아니라 벌레에게도 잘 돼서 벌레가 많이 꼬인다.
벌래가 꼬이면 죽이면 되지않는가?
국내의 많은 가로등이 주황빛의 저압나트륨등으로 많이 바뀌었는데,
아직 수은등이 많이 남아있는 제주도의 경우를 보면
멸종위기 곤충들이 길가에 죽은 채 널부러져있다.
백색 수은등에 벌레가 꼬인다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불편함 측면에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 보존과도 연관지어 생각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.
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파장에 벌레가 모이고, 돌아가지 못해서 죽어버리는 상황인데
본능에 따라 달려든 벌레가 문제일까, 그 가로등을 만든 인간이 문제일까?
이러한 이유들이 모여
효율과 생태계 보존을 위해 구형 수은등이 저압나트륨등으로 교체되고 있는 것이다.
'쓸모는 없을 심심풀이 상식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403 Forbidden, 404 Not Found 등 각종 에러코드 해석 (0) | 2022.02.23 |
|---|---|
| (매미사진없음) 매미 종류별 생김새, 울음소리 (애매미, 털매미, 참매미, 쓰름매미, 유지매미, 말매미) (0) | 2021.08.26 |


댓글